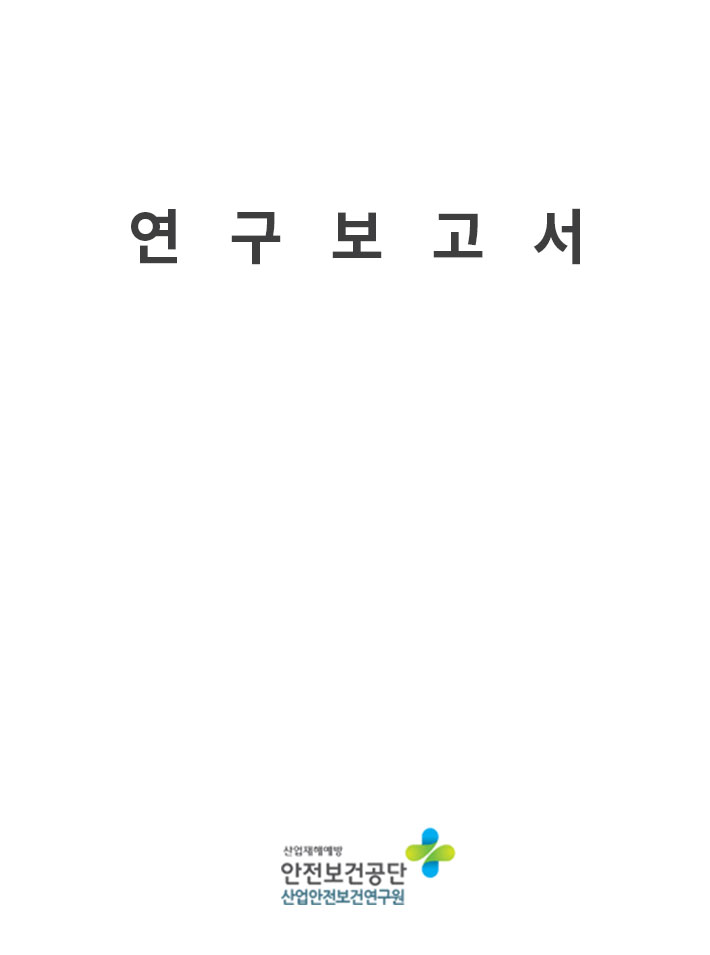연구 보고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과제와 대안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 실중적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연구원의 설립목표를 가장 잘 실행하고있는 보고서입니다.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후각장애 코호트구축 및 예방관리
- 연구책임자
- 조석현 외 3명
- 수 행 연 도
- 2016년
- 핵 심 단 어
- 주 요 내 용
- , 1. 연구제목 : 직업적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후각장애 코호트 구축 및 예방관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후각장애는 일반인구의 약 1-20% 정도 발생하며, 특히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독성물질은 영구적 후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유기용제와 같이 작업장에서 장기간 노출되는 독성 가스에 의한 후각소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후각독성을 평가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비가역적 손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흡입성 독성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후각검사를 시행하여 후각장애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후각장애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코호트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시행하였다. 첫째, 화학유해물질에 폭로된 근로자의 비직업성 요인(성별, 연령, 신장, 체중, 흡연 및 음주력, 전신질환)과 직업성 요인(노출된 화학물질 및 노출기간)을 분석하였다. 둘째, 화학유해물질 폭로에 따른 후각기능의 평가를 위해 관련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객관적 후각지표를 알기 위해 후각기능검사(KVSS)를 시행하였다. 후각지표는 역치(threshold), 식별(discrimination), 인지(identification)로 제시하였고, TDI 점수로 환산하였다. 직업성 후각장애는 TDI 점수기준에 따라 후각감퇴(hyposmia, 31점 미만)와 후각소실(anosmia, 16점 미만)로 분류하였다. 셋째, 대상 작업장에 대한 환경조사는 NIOSH 방법과 KOSHA 방법을 이용하여 화학유해물질을 측정하였다. 넷째, 직업성 후각장애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고위험군과 주요 화학물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화학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직업성 후각장애의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코호트 구축의 타당성 및 계획을 구상하였다. 4. 연구결과 (1) 직업성 후각장애의 유병률 조사에 참여한 총 320명의 근로자 중에서 부비동염 등 후각장애 관련 선행요인이 있었던 32명(10%)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후각장애 관련 분석에 포함된 총 288명 중 후각기능검사(KVSS)에서 TDI 31점 미만인 직업성 후각장애는 193명(67.0%)이었다. 이것은 일반 인구에서 후각이상 발생률인 0-21%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값이었다. 후각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후각감퇴(hyposmia)는 총 187명(64.9%), 후각소실(anosmia)은 총 6명(2.1%)으로 조사되어 직업성 후각장애의 대부분은 후각감퇴에 해당하였다. (2) 주관적 증상에 대한 설문지 평가결과 직업적으로 장기간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주관적 비염증상과 후각증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두 설문평가에서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3) 후각기능검사(KVSS) 결과 자동차정비 근로자의 TDI 중위수는 31.3점으로 정상후각에 해당하였고, 인쇄 근로자의 TDI 중위수는 27.0점으로 후각감퇴를 보였다. 제화와 도금 근로자의 TDI 중위수는 24.5점으로 후각감퇴에 속하였고, 가장 낮은 후각점수를 보였다. 후각역치, 후각식별 및 후각인지 항목은 모두 4 업종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후각기능을 대변하는 TDI 점수도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0). (4) 직업성 후각장애의 위험요인과 고위험군 비직업성 요인 중에서 연령은 후각기능에 영향을 미쳤고, 직업성 요인 중에서는 화학유해불질의 노출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 업종별로 제화업(OR=3.41, 95% CI:1.27-9.20)과 도금업(OR=5.23, 95% CI:1.49-18.71)이 직업성 후각장애의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 화학물질별로는 톨루엔과 IPA가 허용농도(TLV) 10% 이상으로 주요 화학물질로 조사되었으나, 유의한 비차비를 보이지는 않았다. (5)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후각장애의 기전 분석 후각기능검사 결과 후각역치에 비하여 후각식별과 후각인지는 화학유해물질의 노출과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P < 0.05). 따라서 화학유해물질은 감각신경성 후각장애를 유발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이것은 영구적 후각장애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5.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후각독성별 체계적 진단 및 관리방안 도출 - 직업성 후각장애 진단기준 마련 - 작업장 환경기준 개선방안 도출 - 영구적 후각장애의 예방대책 수립 6. 중심어 직업(occupation), 후각(olfaction), 유기용제(organic solvent), 독성(toxic), 코호트(cohort), 예방(prevention) 7. 참고문헌 및 연락처 Peden DB, Bush RK. Advances in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disorders in 2014. J Allergy Clin Immunol. 2015 Oct;136(4):866-71. Doty RL. Olfactory dysfunction and its measurement in the clinic and workplace.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6 Apr;79(4):268-82. Gobba F. Olfactory toxicity: long-term effects of occupational exposure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2006 Apr;79(4):322-31. Shusterman D. Toxicology of nasal irritants. Curr Allergy Asthma Rep. 2003 May;3(3):258-65. 연구책임자 :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석현
 이전글 이전글 |
근로자건강센터의 역할, 기능 등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
|---|---|
 다음글 다음글 |
발암물질 노출 추정도구 개발 |